공교롭게도 우리가 만날 날이 3월1일이군요.
거룩한 3월 1일
만세 삼창이 울려 퍼지든 그날
시하늘 174회 시낭송회는 강원 평창 봉평 출신 이영춘 시인을 모십니다.
1976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하신 이래 평범 속에서도 평범을 뛰어넘으려 부단히 노력하신 분입니다.
이영춘 시인은 일제 강점기의 예술지상주의 소설가 이효석의 친척이기도 하지만, 저 아름다운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라도 나올 법한 소박, 순박, 질박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하시는데, 시에서 이 분의 실제 어조나, 시집에 실린 작품들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 시집 『봉평 장날』(서정시학)을 내시고 시심의 깊이가 날로 무르익어 가시는 분으로 시하늘을 사랑하시는 열정에 고마움을 전하며 초대합니다.
초봄의 문턱에서 함께 하고자 하오니 삼삼오오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2년 3월 1일 첫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 대구 수성못 레스토랑 '케냐'
-회비 : 없으며 음식은 직접 구매하셔야 합니다
-제공 : 詩하늘 봄호, 시 낭송용 소시집
-연락처 : 가우 010-3818-9604/케냐 레스토랑 053-766-8775
*시인 이영춘
-강원도 평창 봉평에서 출생
-경희대학교 국문과 및 동대학원졸업
-강원일보기자. 다년간 중.고등학교 교사 및 원주여고교장으로 퇴임.
-1994년-2002년 한림성심대학 교양학부 외래교수.
-1976년 『월간문학』으로 등단
-시집『시시포스의 돌』,『슬픈 도시락』,『시간의 옆구리』,『봉평 장날』외 다수.
-수필집『그래도 사랑이여!』외
-논문집『김소월 시에 나타난 무속성 연구』등
-수상 : 1987년 윤동주문학상, 1987년 강원도문화상, 1993년 경희문학상,
2005년 대한민국향토문학상, 2009년 시인들이 뽑은 시인상,
2011년 인산문학상 등
-현재 : 한림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창작반 출강.
슬픈 도시락.1
-이영춘
춘천시 남면 발산중학교 1학년 1반 유창수
고슴도치 같이 머리카락 하늘로 치솟은 아이
뻐드렁 이빨, 그래서 더욱 천진하게만 보이는 아이,
아이는 점심시간이면 늘 혼자가 된다
혼자 먹는 도시락, 내가 살짝 도둑질하듯 그이 도시락을
훔쳐볼 때면 아이는 씩-웃는다 웃음 속에 묻어나는 쓸쓸함,
어머니 없는 그 아이는 자기가 만든 반찬과 밥이 부끄러워
도시락 속으로 숨고 싶은 것이다 도시락 속에 숨어서 울고 싶은 것이다
어른들은 왜 싸우고 헤어지고 또 만나는 것인지?
깍두기조각 같은 슬픔이 그의 도시락 속에서
빼꼼히 세상을 내다보고 있다
홀로 사는 집
-이영춘
댓돌 위에 신발 한 켤레
그린 듯 누워 있다
지붕 위에서 놀던 햇살이 자박자박 걸어 내려와
몰래 신발을 훔쳐 신어보고 달아난다
조그만 쪽창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누가 있을까?
궁금한 낮달이 기웃거리다 그림자 남기도 돌아간다
쪽마루 밑에 숨어 지켜보던 들고양이, 냉큼
댓돌로 뛰어 올라가 방안을 들여다 본다
거기, 마른 새우 등처럼 웅크린 어머니가
홀로 관棺으로 드는 길,
그 길을 내고 있었다
해, 저 붉은 얼굴
-이영춘
아이 하나 낳고 셋방을 살던 그 때
아침 해는 둥그렇게 떠오르는데
출근하려고 막 골목길을 돌아 나오는데
뒤에서 야야! 야야!
아버지 목소리 들린다
“저어---너---, 한 삼 십 만 원 읎겠니?”
그 말 하려고 엊저녁에 딸네 집에 오신 아버지
밤 새 만석 같은 이 말, 그 한 마디 뱉지 못해
하얗게 몸을 뒤척이시다가
해 뜨는 골목길에서 붉은 얼굴 감추시고
천형처럼 무거운 그 말 뱉으셨을 텐데
철부지 초년 생, 그 딸
“아부지, 내가 뭔 돈이 있어요?!”
싹뚝 무 토막 자르듯 그 한 마디 뱉고 돌아섰던
녹 쓴 철대문 앞 골목길,
가난한 골목길의 그 길이만큼 내가 뱉은 그 말,
아버지 심장에 천 근 쇠못이 되었을 그 말,
오래오래 가슴 속 붉은 강물로 살아
아버지 무덤, 그 봉분까지 치닿고 있다
시간의 저쪽 뒷문
- 이영춘
어머니 요양원에 맡기고 돌아오던 날
천 길 돌덩이가 가슴을 누른다
“내가 왜 자식이 없냐! 집이 없냐!” 절규 같은 그 목소리
돌아서는 발길에 칭칭 감겨 돌덩이가 되는데
한 때 푸르르던 날 실타래처럼 풀려
아득한 시간 저 쪽 어머니 시간 속으로
내 살처럼 키운 아이들이 나를 밀어 넣는다면
아, 아득한 절망 그 절벽……
나는 꺽꺽 목 꺾인 짐승으로 운다
아, 어찌해야 하나
은빛 바람결들이 은빛 물고기들을 싣고 와
한 트럭 부려놓고 가는 저 언덕배기 집
생의 유폐된 시간의 목숨들을
어머니의 시간 저쪽 뒷문이 자꾸
관절 꺾인 무릎으로 나를 끌어당기는데
컵라면
-이영춘
오글오글한
머리들이 모여 있다
혹은 웃는 듯도 하고
혹은 우는 듯도 한
그 얼굴들은
마치 내 동생이
직공 생활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마치던
마산 어느 공단의 여공들 얼굴 같아서
감히 나는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목줄기가 배배 꼬여진다
마치 내 동생의
피와 살이
내 건강한 폐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만해마을에서의 하룻밤
-이영춘
큰 산이 나를 안고 잠을 잤다
나는 밤새 그의 품속에서
하얗게 설레였다
몇 억겁이나 흐르면
그를 닮은
큰 아이 하나 낳을 수 있을까
들풀
-이영춘
세상이 싫고 괴로운 날은
바람센 언덕을 가 보아라
들풀들이 옹기종기 모여
가슴 떨고 있는 언덕을
굳이 '거실'이라든가
'식탁'이라는
문명어가 없어도
맑은 이슬로 이슬처럼
해맑게 살아가는
늪지의 뿌리들
때로는 비오는 날
헐벗은 언덕에
알몸으로 누워도
천지에 오히려 부끄럼 없는
샛별 같은 마음들
세상이 싫고
괴로운 날은
늪지의 마을을 가 보아라
내 가진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한 순간.
상강霜降
-이영춘
하늘이 온 몸 움직여
지구의 반대쪽으로 발을 옮긴다
몸 낮춘 짐승들 시린 발 움추린다
무릎 시린 나도 온통 빈 몸이다
앙상한 뼈 곧추세워 대지를 가르는 멧새들,
어느 곳에 이르러
하늘 문 한 쪽에 몸 눕힐 것인가
시간의 옆구리
-이영춘
“김도연의 소설을 읽으면 시간의 옆구리 같은 걸 느낄 수 있단 말야!”
소설가 이외수의 말이다
난 그 말의 의미를 한참 생각했다
시간의 옆구리? 시간의 옆구리라?
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것들
보편적인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
과거, 현재, 미래에서 툭 튕겨져 나간 것들
가야 할 길 위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있어야 할 사람 집에 다른 무엇이 살고 있는 것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다른 시제가 생성된 것
엉뚱한 것들, 엉뚱한 짓들,
정상적인 혹은 보편적인 상황 위에
또 하나의 엉뚱한 시츄에이션,
지하도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나라
석, 박사가 되어도 일할 곳 없는 나라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나라
툭 터져 나간 옆구리 시간의 나라
작년 가을 내 칸나는 40세 젊은 나이로
옆구리 나라로 툭 튕겨져 나가고 말았다
아픈 시간의 옆구리,
피 철철 흘리는 옆구리 나라의 사람들
눈(雪)을 받아 적다
-이영춘
눈 내리는 날 광장서적 라운지에 앉아
유리벽 결 따라 이동하는 눈발에 내 눈알 박아 넣고
눈발 사이에 끼인 나를 꺼내 받아 적는다
시린 발 움츠리며 한 쪽으로만 기울어졌던 한 세기
밥이 될 수 없었던 아득한 한 세기의 곤궁한 눈발이
아린 목구멍으로 쏟아져 내린다
십 리 이십 리 길 걸어 아득히 닿을 수 없던 하늘 저 쪽
아버지 찾아 길 떠난 동생들은 눈 속에 묻혀 돌아올 길을 잃고
산비탈 언덕 아래 불 꺼진 그 집, 침묵으로 울음 삼키는데
섬돌 위에 누워 있는 신발 한 켤레 홀로
문밖 인기척에 귀 기울여 젖고 있다
눈발에 묻혀간 나의 그들은 지금 이 광장 라운지 어느 문틈
사이에서 눈물로 지워지고 있나
어느 생을 건너기 위해 다시 살아나고 있나
눈발은 내리는데, 내려
죽은 새들의 이름으로 되돌아와
내 붉은 심장에 푹푹 내리 꽂히는데
삭히지 못한 열 두 모금의 뜨거운 울음
입속에서 붉은 가시로 돋아나 왈칵
더운 피를 쏟아낸다
봉평 장날
-이영춘
올챙이국수를 파는 노점상에 쭈그리고 앉아
후루룩 후루룩 올챙이국수를
자시고 있는 노모를 본다
정지깐* 세간사 뒤로 하고
한 세기를 건너와 앉은
푸른 등걸의 배후,
저문 산그림자 결무늬로
국수올들이 꿈틀꿈틀
노모의 깊은 주름살로 겹치는
허공,
붉은 한 점 허공의 무게가
깊은 허기로 내려앉는
한낮.
'좋은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照見堂에서 (0) | 2012.03.18 |
|---|---|
| [스크랩] 2011년 제3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봄전시 본상 - 우수상(황선희) (0) | 2012.03.06 |
| 흑용 (0) | 2012.01.17 |
| [스크랩] 시인이 뽑은 시인상 수상 "이영춘선생님" (0) | 2009.12.21 |
| [스크랩] 백담사만해마을 "우리시대 대표작가와의 만남 //강원도민일보 (0) | 2009.12.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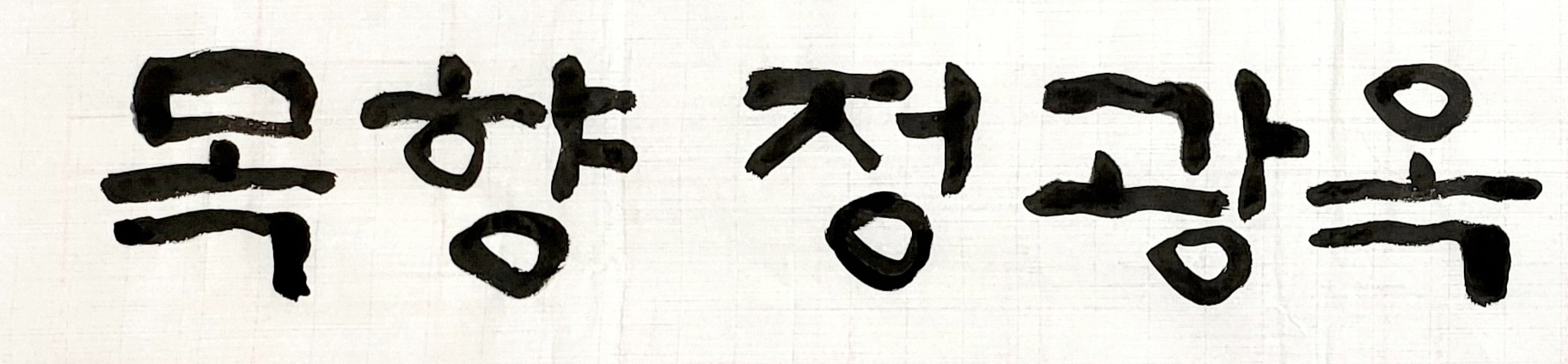
댓글